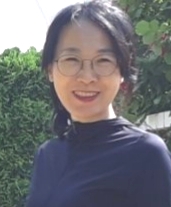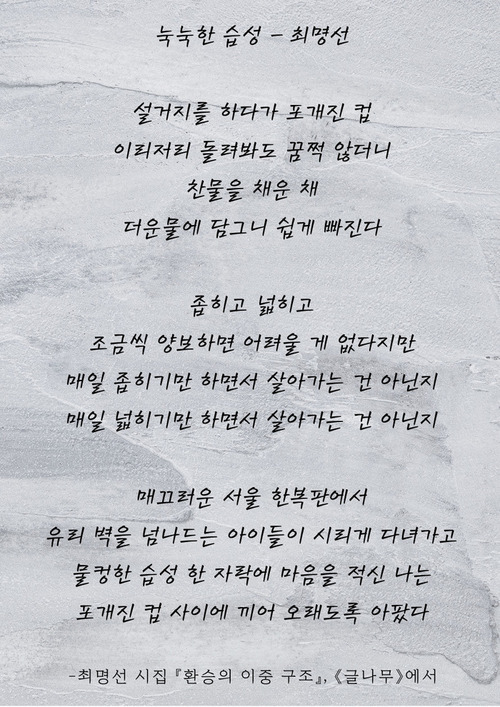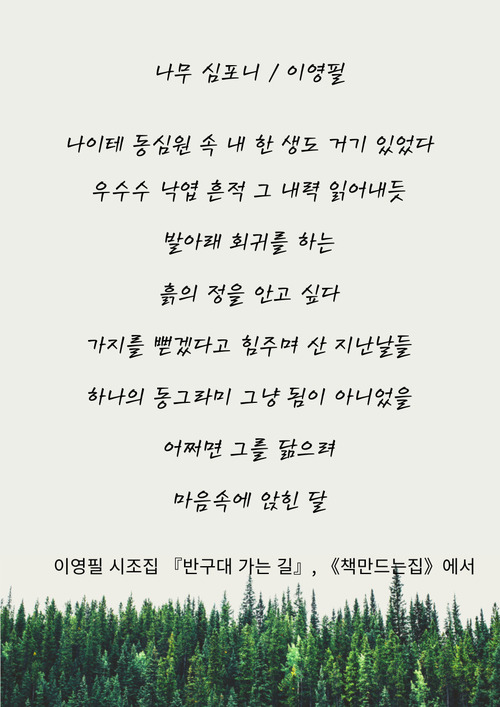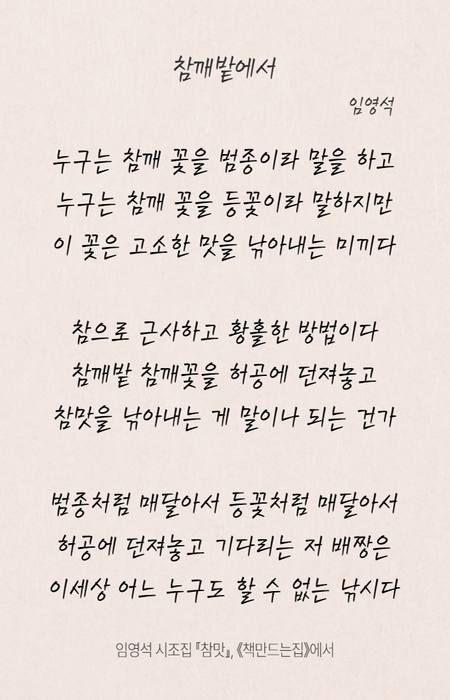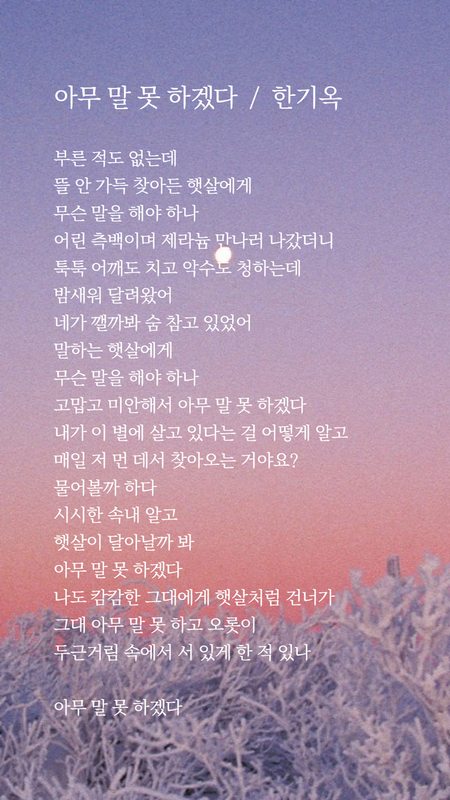전날 밤에 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대도시 레온은 아침이 되니 조용했다. 레온대성당 앞을 지나 일찍 문을 연 카페에서 간단히 토스트와 주스로 아침을 먹었다. 거리 청소하는 사람, 말쑥하게 차려입고 바삐 출근하는 사람,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보고 있자니 새삼 산티아고 순례 길에 있다는 현실이 신기하기만 했고 현실에서 멀리 떠나온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다.
도심을 걷다가 문이 열린 성당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 아늑한 곳이었다. 현지인으로 보이는 분들과 몇몇 순례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스페인 국민 대다수는 로마가톨릭교를 믿는다 하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이 길에서 아직도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의 기도라도 해볼까 싶었지만 역시나 기도는 영 어색했다.
레온 중심지를 벗어나기 전에 만난 산 마르코스 수도원은 조각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어서 발길을 멈추게 했다. 순례자 병원으로 쓰이기도 했고 기사단 본부로도 쓰였다는데 지금은 호텔로 운영되고 있다더니 순례자들과 일반 여행자들이 드나드는 걸 볼 수 있었다.
순례자 숙소로 제공하는 유서 깊은 수도원에서 하루 머무는 것도 산티아고 순례 길의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일반인들을 위해 개방하여 운영된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다. 지나온 마을에서도 출입문과 벽에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는 걸 보니 가문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을 증명하는 듯했다.
호텔 앞 산 마르코스 광장에는 돌로 된 십자가가 있었고 그 아래 청동으로 된 순례자 좌상이 있었다. 신발을 옆에 벗어두고 눈은 감고 두 손을 다소곳하게 모았는데 고개는 하늘을 향해 약간 든 모습이었다. 지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쉬는 모습인가 싶었다. 어찌 보면 구도자(求道者)의 경건한 자세 같기도 했다.
딸과 번갈아가며 같은 포즈를 취해봤는데 아무래도 순례자가 못 돼서 그런지 눈을 감으니 아예 바닥에 눕고 싶은 마음이 슬금슬금 들기에 떨치고 발길을 옮겼다. 바로 이어지는 멋진 석조 다리를 건너니 레온 도심을 완전히 벗어나는 길로 나가는 걸 알 수 있었다. 강은 이곳과 저곳의 중요한 경계가 될 때가 많은데 그 아래 강물은 너무나 유연하게 흐르고 있었다.
이후로는 그저 뚜벅뚜벅 걸었는데 아침에는 기온이 10도 정도로 괜찮았지만 낮이 되면서 점점 더운 날이었다. 길옆으로 자유롭게 피고 진 마른 풀과 드문드문 나무가 있었지만 바람도 없고 그늘이 거의 없는 길이어서 체감은 더 덥게 느껴졌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차도와 나란히 걷는 구간이 많았고 화물차 통행량도 많다 보니 매연 때문에 호흡이 불편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는 순간부터 숨을 참고 있다가 한참 지나고서야 ‘푸아’ 하고 내쉬기도 했는데 호흡이 헝클어지니 걷는 것도 덩달아 힘들었다.
운전자들 중에는 순례자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응원하는 의미로 손을 흔들어 주며 지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운전자의 마음은 고맙지만 그가 몰고 지나간 뒤 남긴 차의 매연은 밉고, 문명의 혜택은 편하게 누리면서도 그로 인한 환경오염은 불편하다. 하긴 평소에 5분 거리에도 차를 몰고 다니던 내가 할 소리는 아닌 듯하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었고 지나는 마을도 평범해 보였다. 공업단지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조금은 삭막하게 다가왔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중세 속에 들어간 듯한 오래된 건축물과 시골길 카미노가 좋긴 좋은가 보다.
점심때가 되어 작은 마을 카페에 들어갔다. 메뉴를 보니 새우가 12.9유로, 문어가 14유로가 넘었다. 보통 순례자용 메뉴는 10유로만 해도 3코스로 아주 푸짐하게 나오는데 이건 얼마나 특별한가 싶었다. ‘모를 때는 비싼 걸 선택하면 실패율이 적다’고 하는 ‘한’의 부추김까지 더해서 이번 여행 중 먹은 것 중에 가장 비싼 음식을 주문했다.
하지만 기다린 끝에 내가 주문한 새우가 먼저 나왔는데 어라? 커다란 접시에 깐 새우 열 마리 남짓 나오는 게 아닌가! 잔뜩 기대하고 기다리던 우리는 '설마 이게 다는 아니겠지?'라는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았다. '달랑 새우만? 그럴 리가?'싶어서 주방 쪽과 접시를 번갈아 보았지만 큰딸이 주문한 것도 딱 문어만 나왔다.
야채 한 장이라도 곁들여 나왔어도 우리의 기대가 그리 허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카페 주인은 약속한 적도 없건만 특별함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였다. 새우만 나온 새우와 문어만 나온 문어를 보니 웃음도 나왔다. 카페를 나온 우리는 비상식량으로 가지고 다니던 바나나를 꺼내 먹는 걸로 출출함을 달랬다. 정말이지 군더더기 없이 아주 정직한 메뉴였다.
오늘은 21km를 걸어서 마을 초입에 있는 공립 알베르게에서 묵기로 했다. 오래된 작은 의원 건물처럼 여겨지는 곳이었는데 피곤함이 누적되어 더 걷기도 힘든 데다 5유로의 적은 숙박비였기에 감수하기로 했다. 시설이 좀 낡은 것에 대한 불편함은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호스피탈레로는 중년을 넘긴 남자분인데 매우 자상하면서 친절했다. 레온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서 다음 날 10시 돼서야 청소하러 오니까 그전까지는 편하게 있다가 가도 된다고 하고 일찍 퇴근하셨다. 그러잖아도 텅텅 빈 알베르게는 우리 전용인 것처럼 넓고 편안하고 오붓하게 지낼 수 있었다.
큰 도시 뒤에 만나는 작은 마을이라 그런지 더 편안하게 여겨졌다. 내킨 김에 내일 아침에도 느긋하게 출발하기로 했다. 순례 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유쾌함도 있지만 피로가 쌓여 조용히 쉬고 싶을 때도 많은데 오늘은 다들 조용함을 누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