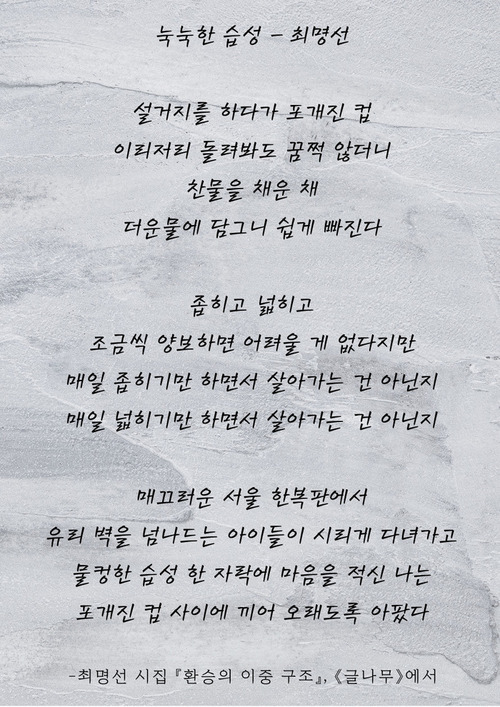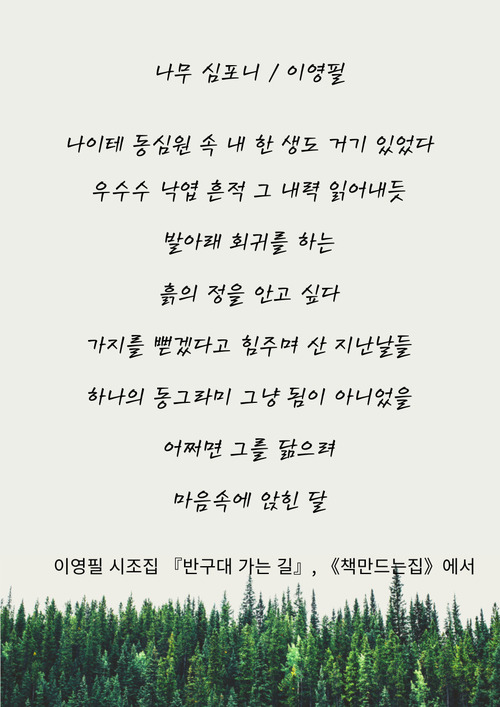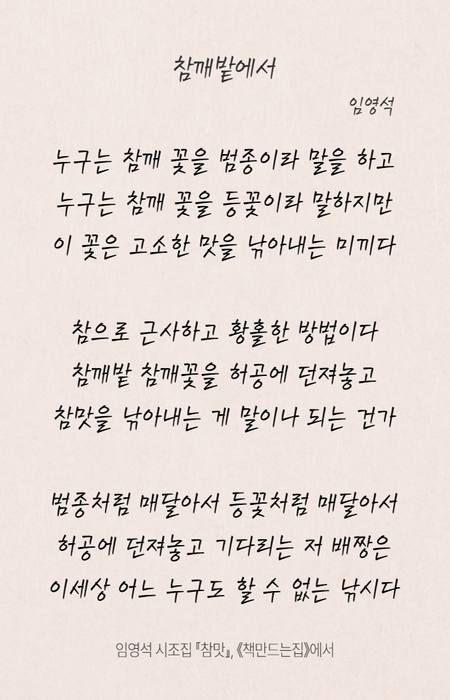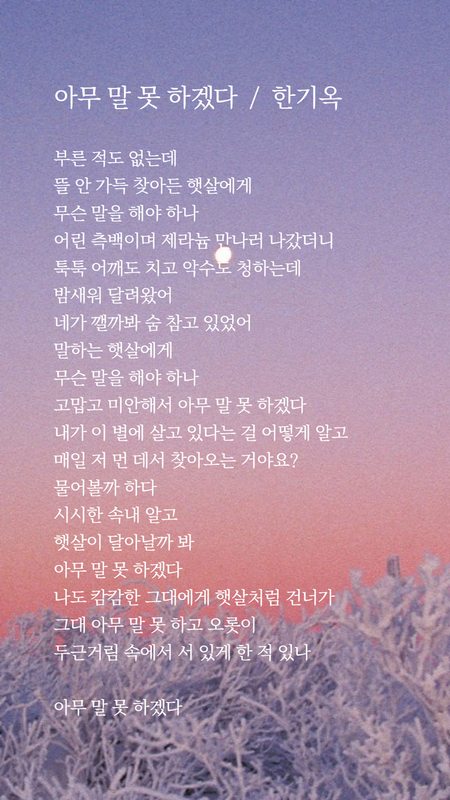카미노에서의 10일째…날마다 산티아고라는 문을 하나씩 열어가는 중
| ▲ 길 위의 풍경 "카미노 위에서 동트는 곳을 향해" © UWNEWS |
|
[울산여성신문 정은주 객원기자] 카미노에서의 10일째 아침을 맞았다. 간밤에 베드 버그(빈대)에 물린 여행자가 있어서 잠시 소란이 있었다. 우리와 동행했던 ‘한’과 이탈리아에서 왔다는 젊은 여성이 물렸는데 그 여성은 약을 발랐는데도 괴롭다면서 울음까지 터트렸다. 베드 버그의 악명을 들었긴 했지만 빨갛게 부어오른 붉은 반점들을 보니 멀쩡한 내 몸까지 가려운 듯했다.
매일 많은 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알베르게의 특성상 침대 시트를 새로 받고 개인위생을 챙긴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도보 중 만난 여행자들은 베드 버그로부터 무사했는지 안부 인사를 주고받기도 한다. 다행히 우리는 아직 무사했지만 앞으로 어떨지 알 수 없다.
어둠이 채 걷히기 전에 길을 나섰는데 카미노 위에는 앞서 출발한 많은 사람들이 점선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노란 화살표나 조개 모양이 아니더라도 순례자들이 곧 카미노의 이정표가 되었다. 한 번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앞선 사람만 보고 따라가다가 뒤늦게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알고 되돌아오는 때도 있다. 그러고 보면 누군가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되거나 훌륭한 길잡이를 만난다는 것은 적은 복이 아닌 듯하다.
서북 방향으로 걷는 동안 등 뒤 동쪽에서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잠시 돌아서서 동이 트는 곳을 향해 크게 심호흡했다. 오늘도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되니 햇살 한줌에 감사했다.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하면 어쩐지 밀어줄 듯했다. 누군가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면 새로운 힘이 솟고, 더 용감해질 수 있을 듯했다. 매일 떠올랐던 해였고 늘 비추던 햇빛이건만 카미노에서는 새삼스레 다가왔다.
항생제를 연달아 먹어서인지 발톱에 생긴 염증도 가라앉았고 컨디션이 좋아지니 한 시간에 5km를 걸을 수 있었다. 서리의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았던 탐스러운 포도밭이 점점 없어지고 어느 때부터 보이지 않았다. 눈을 들면 파란 하늘이, 눈을 내리면 밀 수확을 끝낸 빈 들판이 완만하게 오르락내리락하였고, 거기에 나란히 조금 굵은 실 같은 길이 이어졌다.
산토도밍고 데 라 칼사다(Santo Domingo de la Calzada)라는 도시도 지나왔는데 이곳은 산티아고 가는 길 때문에 만들어졌으며 도시를 설립한 성(聖) 도밍고 가르시아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했다. 같은 이름의 대성당에는 닭에 얽힌 유명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순례길에 올랐다가 누명을 쓰고 교수형에 처해진 청년이 성(聖) 도밍고가 지켜줌으로써 다시 살아났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코웃음치는 수도원장 앞에 식탁의 닭고기가 꼬끼오 하고 되살아나게 하는, 그야말로 기적의 전설이었다. 듣고 나니 지나온 길에 지붕 위에 있던 닭 모양 조형물도 이해하게 되었다.
성당 앞에는 순례자들에게 필수품인 조가비와 지팡이, 가방, 신발 등을 표현한 조형물도 있었는데 닭의 전설처럼 신비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례 길을 걷고 있는 나의 이야기도 되니 도시 전체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이야기보따리인 셈이다.
오늘 23km 가량 걸어서 도착한 그라뇬(Granon)은 산티아고 가는 길의 리오하(Rioja)주(州) 마지막 마을이다. 우리가 묵은 알베르게는 그라뇬 중심에서도 1.5km 가량 더 걸어가야 해서 힘이 들긴 했지만 고목으로 둘러싸여 아담하면서도 유서가 깊어 보이는 곳이었다. 정원에 쌓인 낙엽이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었다.
프랑스인 호스피탈레로(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사소통에 한참이 걸렸는데도 온화한 모습으로 기다려주었고, 배낭을 3층까지 올려다 주는가 하면 빨래가 다 되자 건조까지 해서 방에 가져다주는 등 매우 친절했다. 다만, 음식 솜씨마저 매우 겸손해서 시장이 반찬이라는 마음으로 먹어야 했다. 차린 밥상이라고 해서 내 입맛에 다 맞을 수는 없으니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산책하려고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1층 식당 옆으로 문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 뜻밖에도 성당이었다. 마을에서 찾아올 때 마치 수도원 가는 기분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다. 보물 찾기라도 한 듯했다. 기도를 올리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엉거주춤한 이방인이 머물기에는 어쩐지 미안한 마음에 잠시 있다가 나왔다.
실내는 아늑했고 샤워 물도 속 시원하게 나와서 환호성이 나올 정도라 우리들은 숙소를 잘 선택했다며 자축했다. 지붕 한쪽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침대에 누우면 별을 볼 수도 있었다. ‘한’은 기분 좋게 침대에 몸을 날렸는데 알고 보니 침대의 매트리스가 심하게 푹 꺼진 것이었다. 몸이 새우처럼 꼬부라진 모양이 되어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이대로 아침까지 자고 나면 아무래도 엿가락이라도 되어 있을 듯해서 옆 침대로 옮겨야 했다.
산티아고를 향한 도보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에게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 끝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위치와 함께 열정, 투우, 레알 마드리드, 돈키호테, 피카소가 떠오르는 정도였다. 날마다 산티아고라는 문을 하나씩 열어가는 느낌이다. 다음 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