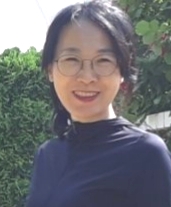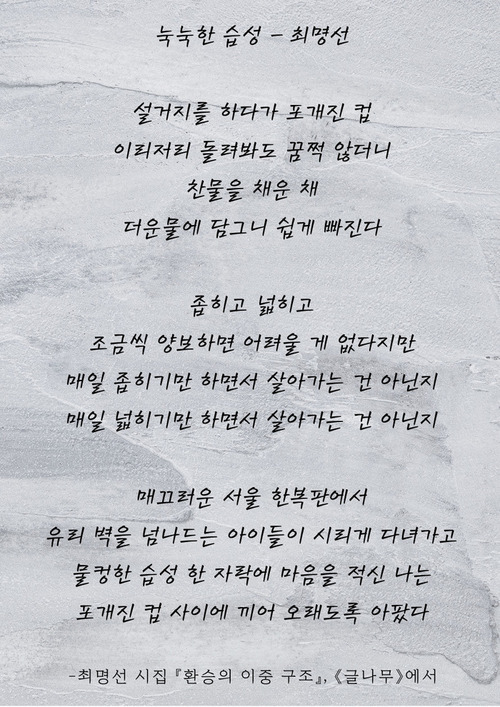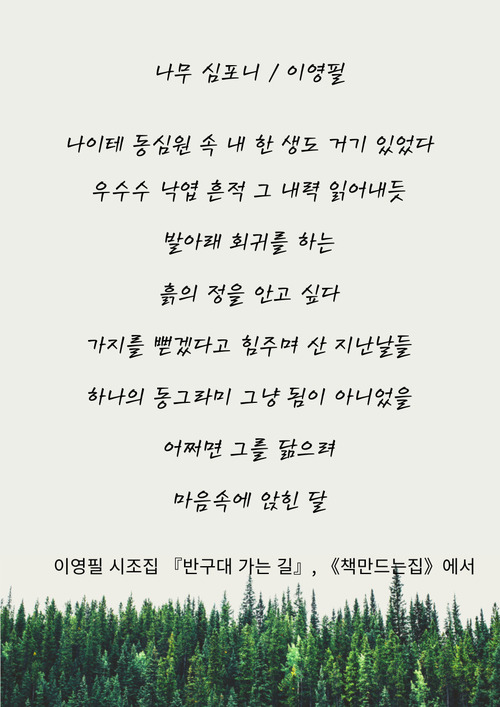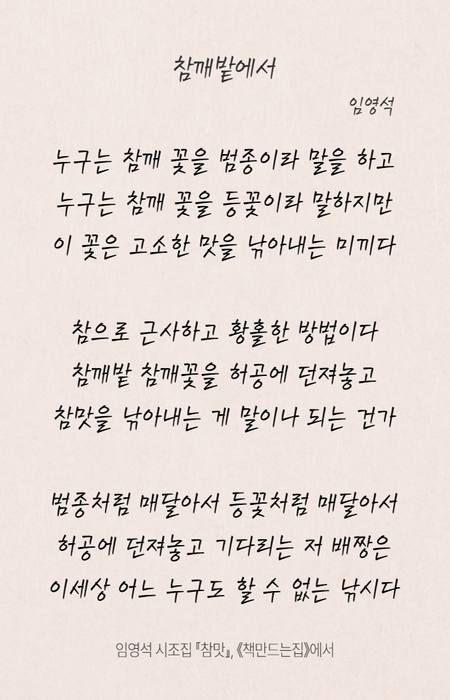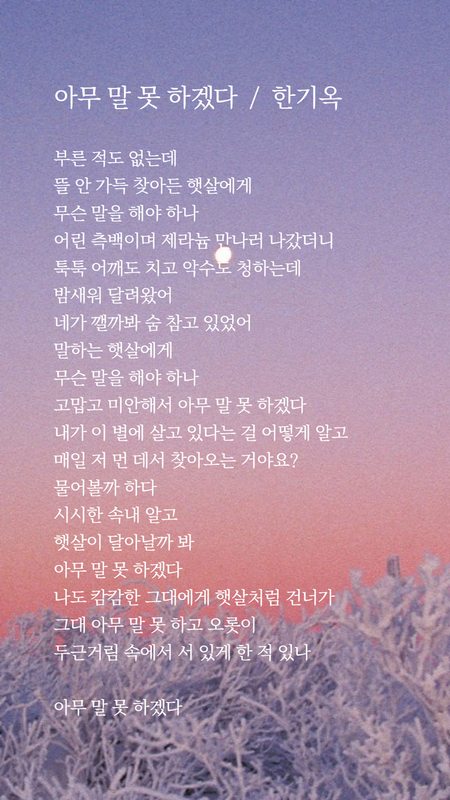[울산여성신문 정은주 객원기자] 이른 아침 눈을 뜨니 주위가 조용했다. 알베르게에 우리 일행만 있었기에 어둠 속에서 짐을 챙겨 나가는 사람들로 인해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젯밤에는 다 쓴 일기를 사진과 함께 올리는 과정에서 두 번이나 날아가 버려서 결국 다시 써야 했다.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으니 흔히 있는 일이고 감수해야 할 것 중 하나였다.
전날 저녁이 다 되어 알베르게에 도착한 '막달'이라는 아가씨는 특별히 아끼던 라면 두 봉지와 컵라면 하나를 내놓으며 같이 먹자고 했다. 이곳에서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라면을 파는 가게는 한국인들 사이에 알짜배기 정보로 공유하기도 했다. 그런 라면을 하룻밤 인연의 의리(?)로 선뜻 내놓았으니 귀한 대접을 받았고 원래 라면을 좋아하지 않던 나도 국물까지 훌훌 남김없이 먹었다.
그녀는 세례명이 '막달리나'였는데 우리는 줄여서 ‘막달’이라고 불렀다. 원래는 걷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잘 걷는 편이었는데 첫날 피레네산맥을 넘을 때 무리했다고 한다. 그 바람에 다리가 아파서 한쪽 다리를 끌고 있었고 주로 버스로 이동하고 짧은 거리만 걷는다고 했다.
카미노에서는 무거운 배낭을 지고 절룩거리면서도 도보를 고수하는 순례자들도 있지만 어려운 구간은 버스를 이용하여 껑충 이동하는 이들도 많다고 했다. 구간에 따라 갑자기 카미노 위에 사람들이 뜸한 게 이상하였는데 그 이유를 막달을 통해 다시 듣게 됐다.
급할 것 없이 느긋하게 준비하고 9시가 넘어서야 숙소를 나섰다. 마을 중심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 앞으로 산티아고까지 298km 남았다는 표시가 어느 집 벽면에 커다랗게 쓰여 있었다. 500km 정도나 걸었다니 우리는 뿌듯한 표정이 되어 쳐다보며 오늘을 응원하며 출발했다.
이틀 후부터 메세타 길은 끝나고 산지가 많은 갈리시아 지방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그래서 하루에 25km는 넘지 않도록 무리하게는 걷지 말자고 했다. 딸의 컨디션에 맞추려니 따라가기가 버거웠는데 반갑고 고마운 배려였다.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기온은 어제보다 2~3도 낮았다. 주로 옥수수밭이 이어졌는데 아직 베지 않은 곳이 많았고 바람이 불면 바스락 소리가 날 정도로 말라있었다. 이미 베어 낸 빈 들판에는 까마귀 떼가 앉았다가 날았다가 자유로이 움직이고 있었다. 인간이 거둬간 후 언뜻 봐서는 빈 들판인 듯 보이지만 새들에겐 천국인가 보다.
옥수수밭을 따라 수로가 나란히 설치돼 있어서 물이 흐르고 있었다. 황톳길을 걸을 때면 신발에서 전해지는 느낌이 좋았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길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풀숲에서 동그랗게 몸을 웅크린 자세로 자고 있었다. 우리가 바로 옆을 지나가도 도망가지 않고 실눈만 뜬 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면 여행자들에게 먹이를 자주 해결할 수 있었나 싶었다.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크게 힘든 구간이 아니어서 중간에 쉬지 않고 걸었더니 어느새 오늘 머물게 될 산 마르틴 델 카미노라는 마을이 보였다. 멀리서 우뚝 솟은 낡은 종탑과 옹기종기 붉은 지붕들이 보였다. 마을 초입에 가까이 가니 몇 천 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듯 견고한 고딕풍의 아치로 된 멋진 다리가 나왔다.
'엘 파소 온로소 다리'인데 '명예스러운 통과'라는 의미로 로마시대에 축조되어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다리 중 하나라고 한다. 그 유명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모티브가 된 것이라고 했다. 아래로 오르비고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강기슭에는 나무들이 작은 숲을 이루며 서있었다.
다리 건너편에는 영화 장면처럼 중무장을 한 중세 기사 그림과 함께 다리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한 안내판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돈 수에로 데 키뇨네스라는 중세 기사에 대한 사랑과 결투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다.
그는 사랑에 빠진 여인에게 거절을 당했는데 이 다리를 통과하는 기사 300명과 싸워서 이기기 전에는 목에 쇠로 만든 칼날을 풀지 않겠다고 했단다. 이 소문을 듣고 각지에서 기사들이 몰려들었고 결국 그들과 싸워 이겨냄으로써 사랑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명예도 회복했다고 한다.
중세 기사 이야기여서 그런지 사랑 이야기도 전투적으로 들리긴 했지만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다리라 한참 머물다가 걸음을 옮겼다. 나에게 있어 명예는 무엇인지? 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명예스러운 통과를 하고 있는 걸까?
다리 중간쯤에 이르자 맞은편에서 건너오는 양 떼를 만났다. 주변을 둘러보니 양들에게 목초를 배불리 먹으려고 강 건너편으로 가는 듯했다. 양치기는 피리 부는 어린 소년이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시골 노인이었는데 긴 막대기를 들고 앞에서 걷고 있었다. 개도 주인 곁에서 있다가 가끔 양 떼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며 몰고 있었다.
양들은 무리 지어 양치기 뒤를 온순하게 따라가고 있었다. 우리는 다리 옆으로 비켜서서 그들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다리 건너에는 가게와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서 강을 경계로 두 마을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어느 가게 앞에는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빨간 호박으로 등을 만들어 내놓은 것도 보였다. 알베르게에 도착하니 17km만 걸어서 크게 무리는 아니었지만 오른쪽 발가락에 생긴 물집을 뜯었던 자리가 쓰리긴 했다. 왼쪽에 잡힌 물집은 안 건드려야겠다. 오늘도 걷는 것 외에 특별할 게 없이 단순했고 내일도 일어나면 산티아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