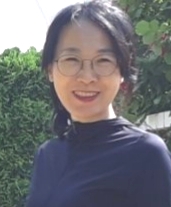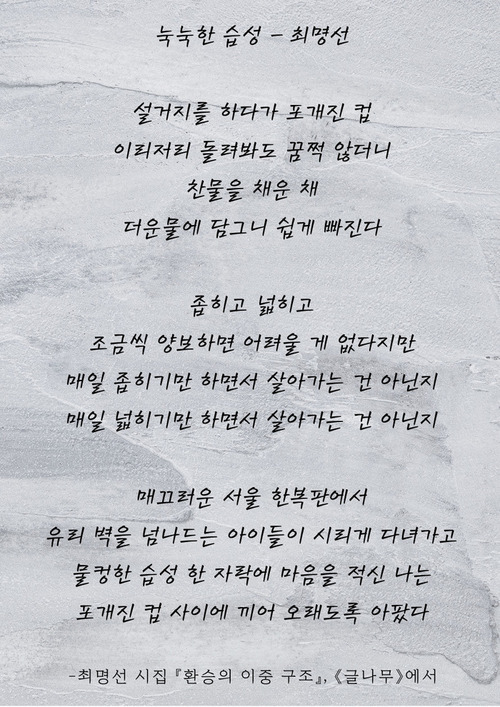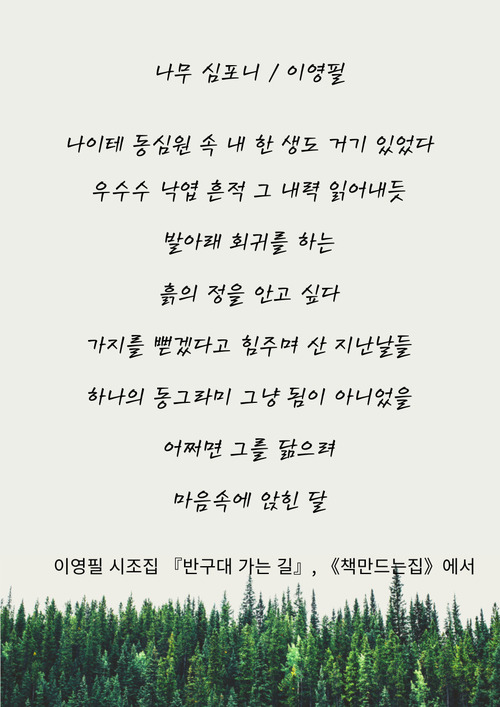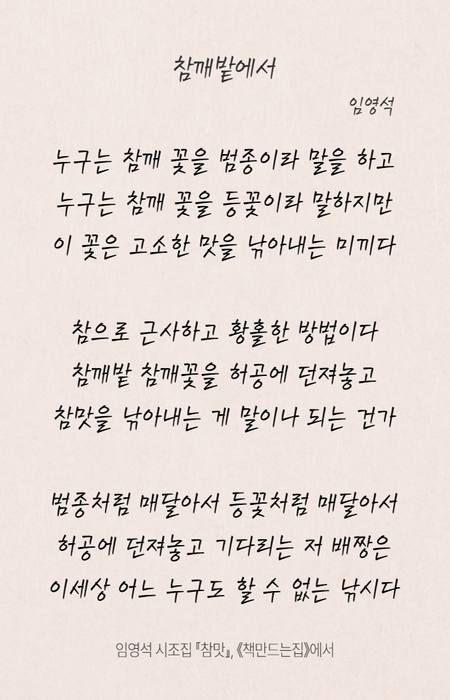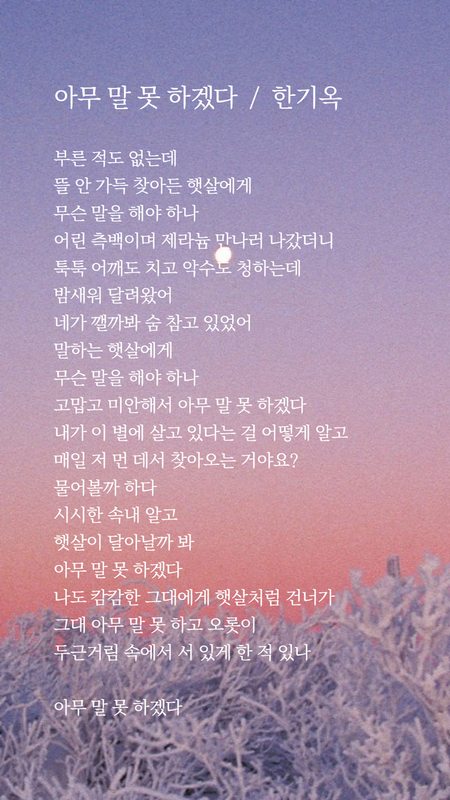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 8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깜깜하다. 어둠 속에서 일찌감치 나서던 여느 때와 달리 다른 여행자들도 늦게 움직이고 있었다. 연이틀 빗속을 걸었던 딸과 ‘한’은 사흘째 판초를 입는다면서 출발을 앞두고 부담이 되는 모양이다.
비 오는 날은 채비가 더 많으니 출발이 지체되기 마련이다. 평범한 운동화로 장거리를 걷자니 발도 신발도 날마다 수난이다. 운동화를 비닐로 감싸고 테이핑으로 마무리했다. 테이핑이 모자라서 다른 반창고까지 동원하다 보니 이번에도 양쪽이 각각 다른 색이라 딸로부터 ‘정말 볼품없는 행색’이란 핀잔을 또 듣긴 했지만.
출발하고 한 시간쯤 지나자 우려했던 비는 점점 그치고 잘 그린 가을 풍경화처럼 파란 하늘에 구름이 아주 예쁘게 떠다녔다. 판초는 바로 벗지 않고 한참을 그대로 입은 채 걸었는데 비에 젖지 않게 해줄 뿐 아니라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가끔은 방석이 되기도 하니 아주 요긴하다.
가냘프다 싶은 작은 가로수들이 가지런히 이어지고 두 사람이 걸을 정도의 소박한 순례 길 옆에는 차도가 나란히 있었다. 딱딱한 아스팔트 길은 충격이 발에 그대로 전해지기에 걷기에 피곤하긴 해도 비 오는 날에는 질척하지 않아서 좋은 점도 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햇빛이 비치자 반사되어 길이 빛이 났다.
메세타 구간답게 오늘도 지평선이 펼쳐졌다. 하늘 아니면 땅인 풍경이 너무나 단순하여 명징(明徵)한 곳. 황토색 대지가 까마득히 이어지는데 어느 곳에는 밭 가운데 커다란 날개처럼 펼친 게 있어서 뭔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 스프링클러였다. 한창때는 농부와 함께 바삐 움직였으리라.
대지가 너무 넓어서 차마 내 안에 들이지 못할 듯하다. 넓기도 하려니와 흙이 얼마나 기름져 보이는지 무엇을 심더라도 햇빛 하나로 쑥쑥 잘 자랄 듯 보였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이렇게 광활한 대지를 바라볼 때면 이런 곳을 선물 받은 사람들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부러울 때도 있다.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 한 땅이 필요한가’에 나오는 빠홈은 지나간 모든 땅이 자기 것이 된다는 말에 탐욕이 생겨 죽음에 이르게 되고 결국 그가 차지한 것은 육신을 뉠 작은 무덤뿐이었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자란 톨스토이는 50세가 넘어서 삶에 대한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신 앞에 나아감으로써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데 가야할 방향을 몰라 갈구하며 답을 몰라 헤매는 이가 얼마나 많을까.
산티아고 순례 길에 몇 번씩이나 왔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 다녀온 후에 카미노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한다. 당시에는 걷기에 급급해서 아쉬움에 다시 오게 되고 몇 번을 오고서야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음미하며 걷는 법을 알게 되더라고 했다.
뚜벅뚜벅 걷노라니 스틱이 없는 나를 위해 딸이 자기 스틱 한 짝을 내밀었다. 그렇게 하면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니 안 된다고 했지만 한쪽 스틱만 들고는 총총히 가버린다. 배려를 어찌나 단호하게 하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다. 얼른 스틱을 사야 할 텐데 가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한참 걷다가 사흘 만에 다시 만난 로즈와 서로 반가워서 인사했다. 내 무릎이 괜찮으냐고 물어왔는데 많이 나아졌다고 하니 잘했다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기까지 했다. 나도 화답으로 며칠 전부터 고생하던 기침은 좀 괜찮아졌냐고 물었더니 다 나아간다고 했다. 오늘은 우리보다 마을 한 곳을 더 지나서 묵을 건데 내일 레온(Leon)에서 보자면서 짧은 인사를 나누고 다시 헤어졌다.
중간에 작은 카페에 들러 스파게티를 먹고 나오려는데 한 남자분이 스페인어와 영어로 섞어가며 이것저것 묻더니 내가 앉았던 자리에 있던 판초를 가리켰다. 그제야 내 판초를 찾아주려는 걸 알았다. 그냥 처음부터 손짓만 해도 알았을 텐데. 나는 웃으며 내 이마를 치는 제스처를 하고는 고맙다(‘그라시아스’), ‘아디오스’라고 인사하고 나왔다. 부디 한국인 모두가 덜렁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렐리에고스(Reliegos) 마을 가까이 가니 조그만 언덕처럼 생긴 와인 저장고가 보였다. 어디 수도원 깊숙한 곳도 아니고 길가에 있는 와인 저장고라니. 뜻밖이었지만 오래전에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길의 내력을 알지 못하니 어쩌면 그때 사람들이 훌쩍 와서 보면 이곳에 왜 이런 길이 있냐고 물을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의 도착지인 렐리에고스는 아담한 마을이었다. 이층 높이의 건물 벽에 글자며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는 게 보였다. 카페 이름도 적혀있었는데 그림이나 글자 의미와 상관없이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맞이하는 듯했다.
알베르게에 들어서니 호스피탈레로가 반갑게 맞는다. 앞서 도착한 순례자들의 튼튼하고 두툼한 신발이 입구에 나란히 놓인 채 숨 고르고 있었다. 거기에 비해 너무나 빈약한 내 운동화도 나란히 벗어두었다. 이층으로 된 알베르게에는 방이 여러 개였는데 이 마을에 머무는 순례자들이 적은지 저녁이 돼도 빈 침대가 많았다.
여느 때처럼 샤워와 빨래를 한 후 오늘은 마을 식료품 가게에서 저녁거리를 사 와서 만들어 먹기로 했다. 스파게티와 수프, 요구르트, 오렌지로 모두 합쳐서 6유로 정도만으로 세 명이 먹기 충분했고 맛도 그럭저럭 괜찮았다. 카페의 순례자 메뉴는 1인당 10유로 내외인데 양이 너무 푸짐하여 반 정도 남길 때가 많은데 이렇게 먹어도 되겠다.
오늘도 길은 특별할 것 없이 완만하고 평탄했는데도 20km를 걸어 도착하니 발목이 아팠다. 옆에 있던 한이 “No Pain No Glory!”(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며 웃는다. 아! 나는 과연 어떤 영광을 위해 몸을 혹사하면서 걷고 있는지? 나, 지금 나라라도 구하고 있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