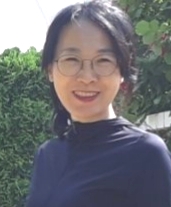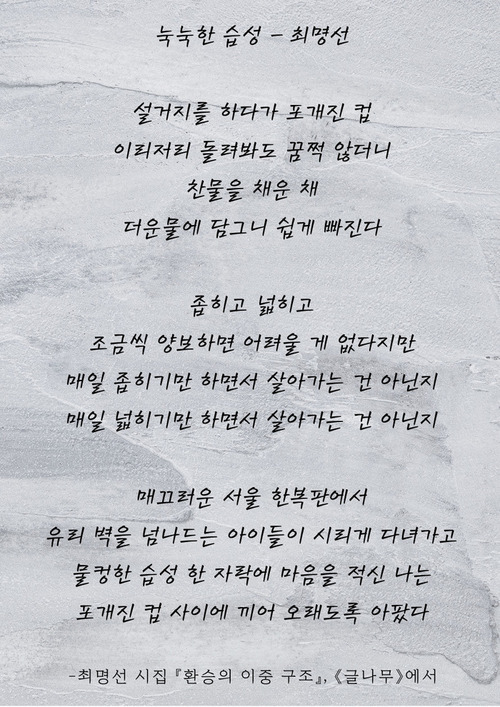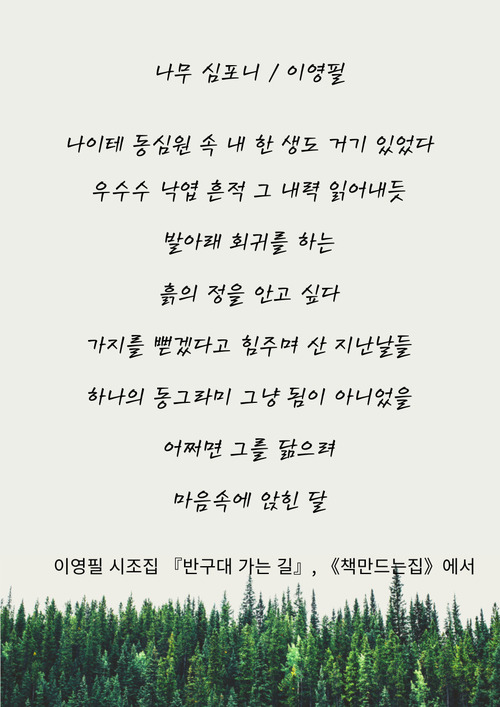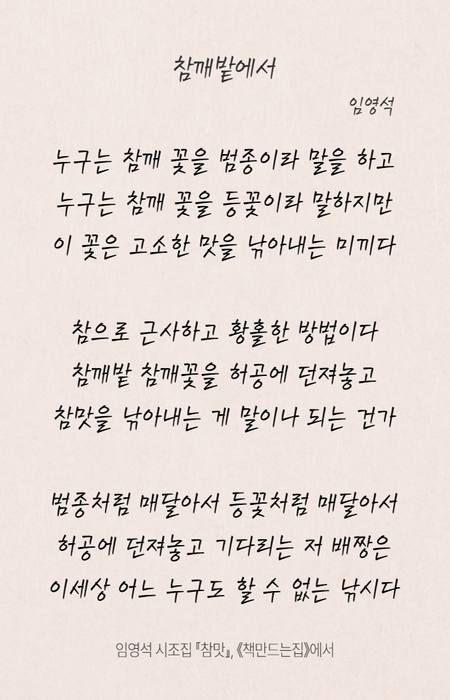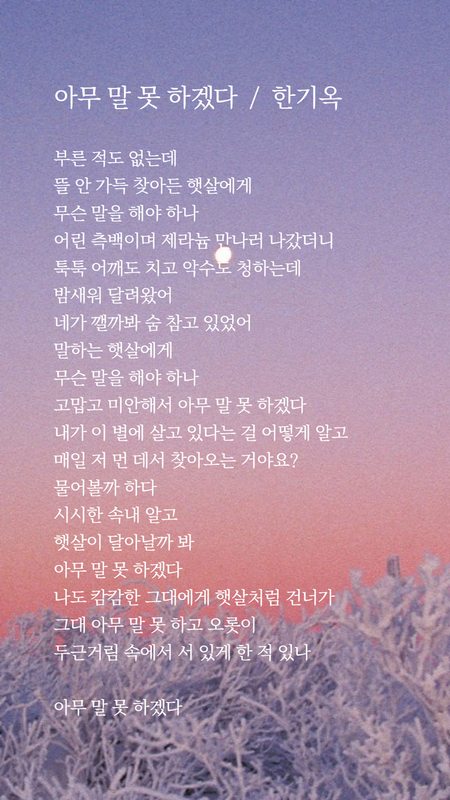[울산여성신문 정은주 객원기자] 산티아고 카미노에 오른 지 어느새 3주가 지났다. 처음에는 뜬금없이 훌쩍 순례 길을 나선 나를 걱정했던 지인들도 사진과 소식을 보면서 조금 위안은 되었던지 이제는 한시름 놓은 듯하다. 딸은 한결같이 걷고 있고 나는 여전히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또 하루 시작이다.
짐을 꾸리고 출발 준비하는데 어떤 여자 순례자는 요가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스트레칭을 한 후에 걷는다고 하였는데 자세를 보니 매우 유연해 보였다. 나도 슬쩍 몇 동작 따라 해 보려고 했지만 에고고 소리만 나오고 요가가 아니라 코미디가 되고 말았다.
카페에 들러 오렌지 주스와 빵으로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나섰다. 늘 그랬듯이 출발은 동시에 했다가도 어느새 ‘한’과 딸은 저만치 앞서가고 나는 한참 뒤에서 걷게 된다. 걷는 속도나 컨디션을 봐서는 한이 왜 아직도 우리 모녀와 일정을 같이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산티아고에서는 가족이나 친구가 같이 왔다가도 사이가 좋지 않아 각자 길을 따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장거리 도보에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예민해지다 보니 상대를 배려하기보다는 불편해하거나 서운할 수도 있는데 성격 좋은 한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오늘은 붉은 황톳길이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이어져서 곱고 예뻤다. 땅에는 일부러 색칠해 놓은 것처럼 청록색이 선명한 풀잎에 이슬이 맺혀 물주머니처럼 조롱조롱 매달려 있었다. 온통 돌멩이로 된 오르막을 오를 때는 발에서 울퉁불퉁한 충격이 전해져 힘이 들기도 했다.

아주 천천히 10km 정도 걸었을까? 입구 바닥에 돌멩이로 동심원을 만들어 둔 독특한 알베르게가 나왔다. 기부제로 운영되는 곳이었는데 히피족이 아닐까 싶은 레게 머리의 백인 청년이 운영하고 있었다. 전기와 수돗물도 안 들어오는 곳이고 집이라곤 과연 바람이나 막을 수 있을까 싶게 한쪽 벽만 있고 천막으로 겨우 가리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서는 고양이 다섯 마리가 서로 장난치고 있었고 다른 순례자들도 저마다 흥미로운 듯 둘러보고 있었는데 어느 외국인은 내게 이런 곳이 파라다이스가 아니겠냐고 했다. 아마도 이곳이 뭔가 자유롭고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다. 그렇지만 막상 이런 곳에 살라고 하면 선뜻 그러겠다고 할 수 있을까?
파라다이스를 한국어로 뭐라고 하느냐고 다시 물어왔다. 한국에서도 그대로 파라다이스라고도 하고 천국, 또는 낙원이라고 했더니 발음을 천천히 따라 했다. 평소에 욕심내던 더 고급스러운 것, 더 편한 것들이 여기서는 거품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떤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지, 그런 곳이 있기는 할까?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을 마시는 순례자 동상을 지나고 돌로 된 십자가상을 지나니 아스트로가(Astorga)가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다. 시(市)청사가 있는 중앙 광장으로 가니 노천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결혼식을 마친 듯 신랑과 신부가 축하를 받으며 광장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바닥에는 꽃잎이 가득 뿌려져 있었다. 부디 앞길도 사랑도 꽃길이기를.
라면을 같이 먹었던 막달을 노천카페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독일 잡지사 소속으로 활동하는 여행기 전문작가라고 했다. 독립영화를 만드는 작업도 하는데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해서 상을 받기도 했단다. 여행 작가답게 우리에게 아스트로가에 대한 해박한 정보도 알려주기도 했다.
아스트로가는 역사가 깊은 곳이다. 고대 켈트인이 세운 도시로 숱한 문명이 거쳐 갔고 반도전쟁 당시에는 프랑스 나폴레옹의 군대와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동맹국 군과 공성전(攻城戰)을 벌였던 곳이다. 로마시대의 다리, 이슬람 양식의 집들, 십자군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고 가장 번성했을 땐 수도원만 해도 열 개가 되고, 스무 개가 넘는 순례자 숙소가 운영되었을 정도라고 한다.
가우디가 설계한 주교궁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관광으로 따로 오는 사람들도 많은 듯했다. 산타 마르타 대성당도 있었는데 우리가 갔을 때에는 시에스타로 문을 닫는 시간이어서 아쉽지만 밖에서만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아스트로가에 대해 좀 더 미리 알았더라면 일정 조정이라도 할 걸 그랬다. 하루 정도 머물고도 싶었는데 동키 서비스로 침낭이 든 배낭을 부쳐버린 터라 그럴 수도 없었다. 우리는 정말 가는 곳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싶었다. 이래저래 잠시 점심을 먹는다는 게 2시간 넘게 머물렀다.
이후부터는 하루의 피곤도 피곤이지만 더위와의 싸움이었다. 그늘도 없는 스페인의 땡볕은 따갑고 아프다. 마른풀이 우거진 사이로 난 좁은 오솔길을 10km 가량 더 걸어야 했는데 중간에 카페가 한 군데 있어서 맥주로 목을 축이며 잠시 더위를 식히긴 했지만 연이은 그늘 없는 길이 이어졌고 땀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우리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힘들다는 말조차 힘들어서 그저 걷기만 했다.
산타 카탈리나 데 소모사(Santa Catalina de Somoza)에 도착하자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었지만 땀에 푹 젖어 있는 옷이라 미루지 못하고 빨래를 해서 널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가을인데도 이런데 여름에 이 시간에 여행하다가는 정말 일사병으로 순교하겠다, 정말이지 길가에 십자가 세우겠다”라며 그제야 서로 웃으며 농담도 했다.
점심시간에 막달과의 수다 삼매경(?)에 빠져 스페인 땡볕의 진수를 톡톡히 맛본 날이다. 땡볕 아래 걸을 때는 '수다 좀 짧게 떨 걸'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멀쩡히 도착하고 보니 웃음이 나오는 걸 보면 지나고 난 고생은 용서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미화되기가 십상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