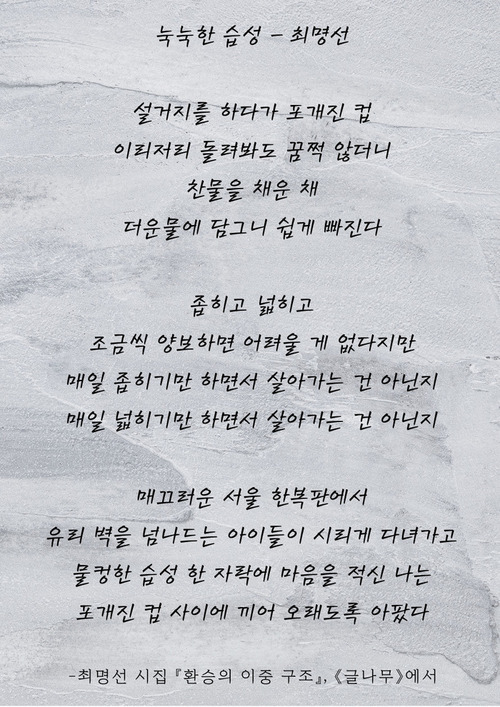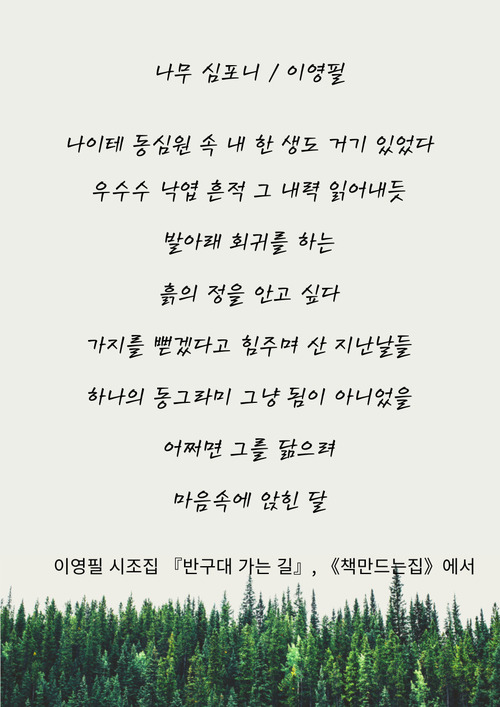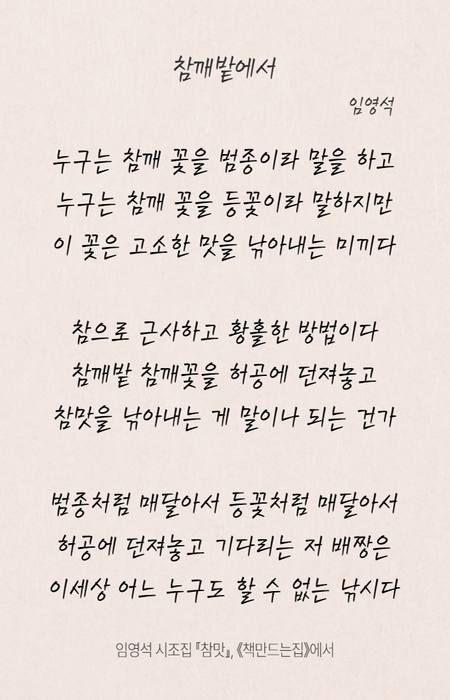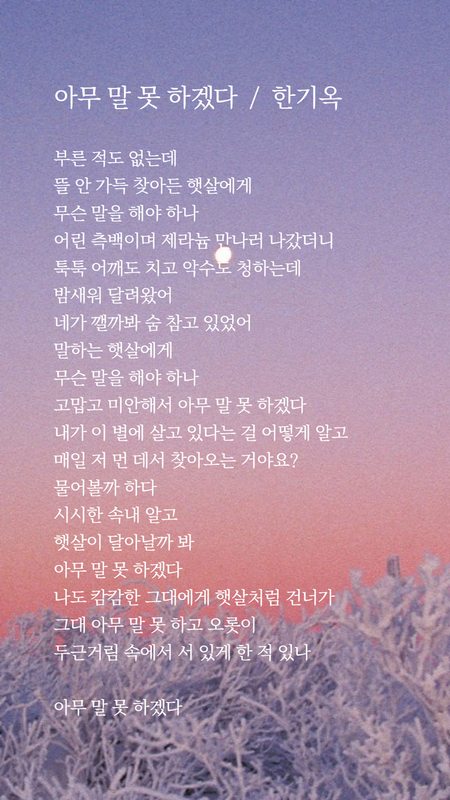“부엔 카미노!(Buen Camino)”
[울산여성신문 정은주 객원기자] 산티아고 순례 길에서 가장 자주 만났던 말이다. ‘좋은’(Buen) ‘길’(Camino)이란 뜻인데 순례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크다. 걷다 보면 지나가는 대형차에서 클랙슨을 울릴 때가 종종 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다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서야 이 또한 순례자들을 응원하는 인사라는 걸 알고는 화답하기도 한다.
처음 며칠간은 길 위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엔 카미노’를 받고 답례하기 바빴다. 그러다 보니 인사가 버겁게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하였고 카미노의 유쾌한 소통에 동참할 수 있었다.
“올라”(안녕)를 주고받을 때도 많다. 현지인들은 미소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지만 표정만 봐서는 도무지 아는 척하지도 않을 듯 무표정에 가까운데도 어김없이 인사를 건네 온다. 마치 인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인 듯했다.
차마 피레네 산맥에 십자가를 세울 수 없어서 겨우 넘어온 자의 결과를 온몸으로 실감하며 이틀째 아침 알베르게를 나섰다. 몇 걸음 못 가서 한국에서 온 일행 둘을 만났다. 한 사람은 전날에 인사를 나눴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서로 ‘부엔 카미노’를 건네며 다시 헤어졌다.
길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790km 남았다는 표지판이 보였다. 산티아고로 향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첫날에 비하면 순탄하지만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길이 이어졌고 수목원을 걷는 듯 조용한 숲길도 지나왔다.
피레네를 넘어올 때보다는 덜했지만 여전히 길에는 가축 배설물이 많았는데 빠르게 익숙해져갔다. 펄쩍 뛰던 딸도 조용해졌다. 젖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는데 바삐 지내던 일상이 여기 와서 모든 것이 슬로모션이 된 듯했다.
전날에 남은 피곤함에다 하루 더 보탠 걸음이라 절룩거리며 주비리에 도착하였다. 알베르게에 도착하고 보니 매우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숙소를 보니 시멘트바닥에 앙상한 철제로 된 이층 침대가 20개쯤 놓여있는 곳이었다. 샤워장도 밖에 공동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몇 개 없어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씻을 수 있었다.
딸이 저녁 먹으러 나가자고 했는데도 너무나 고단하여 몸살이 날 듯 온몸이 아팠다. 끙끙대다가 어느새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밤새 맛있게 잤는지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신통하게도 일어날 수 있었다.
순례 길에서 첫 번째 만나는 대도시 팜플로나로 향했다. 걷기에 알맞은 17도의 기온에 날씨도 쾌청했다. 걷는 동안 스페인의 예쁜 집들과 초원 등 풍경들이 몸의 고단함을 잠시 잊게도 했다.
팜플로나는 9세기 이후엔 나바라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다. 지금은 소몰이 축제인 ‘산 페르민 축제’와 헤밍웨이가 오래 머무르며 글을 썼던 도시라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떤 순례자는 며칠 머물기도 한다.
스페인 북부에 있는 나바라 지역은 첫날에 넘어왔던 피레네 산맥 부근이며 이곳 팜플로나가 중심지라 할 수 있다. ‘가장 힘들면서도 아름다운 구간’이라는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서 첫날에 이미 국경은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바뀌었다.
나바라 지방은 원래는 로마제국 기간에 바스크인들이 살았던 곳이다. 하나의 당당한 왕국이었다가 1500년경에 스페인으로, 일부는 프랑스로 흡수된 곳이다. 여전히 자신들의 언어인 바스크어를 쓰고 있는데 세계 어떤 언어와도 유사성이 없는 독특한 언어라고 알려져 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벽에 “바스크는 스페인이 아니다”라고 바스크어로 써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내가 그 바스크어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도보 중에 만나서 한동안 동행했던 경기도에서 왔다는 신부님이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것이다.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땅과 언어를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바스크인들의 비장함이 느껴져서 한참 서서 봤다.
팜플로나가 가까워 오자 멀리서도 큰 성과 높은 성벽이 눈에 들어왔다. 해자를 지나고 성문을 들어서며 보니 수천 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것 같이 견고해 보이는 성이었고 성 안에도 돌로 만든 집들이 빼곡했다. 갑옷과 투구를 착용한 병사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마치 중세 시대로 들어간 듯하였다.
아침 8시에 출발했는데 더딘 걸음이라 23.1km 거리를 저녁 5시쯤이 돼서야 우리가 묵을 공립 알베르게에 도착했다. 규모가 큰 성당을 리모델링하여 깔끔했다. 커다란 돔 형식의 천장 아래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100명은 족히 묵을 수 있는 곳이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친 시설도 잘 되어있는데 일찍 도착한 여행자들이 음식을 해서 먹고 있었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의 풍경은 쭉쭉 뻗은 길이나 고풍스런 집, 우거진 나무만이 아니었다. 활기가 넘치고 유쾌한 표정의 순례 여행자들 또한 진풍경이었다.
여행을 오기 전에는 어쩌면 사흘도 못 가고 포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했는데 작심삼일은 넘겼다. 마치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 듯했다. 오늘의 한 걸음에 감사하자. 나부터 나를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