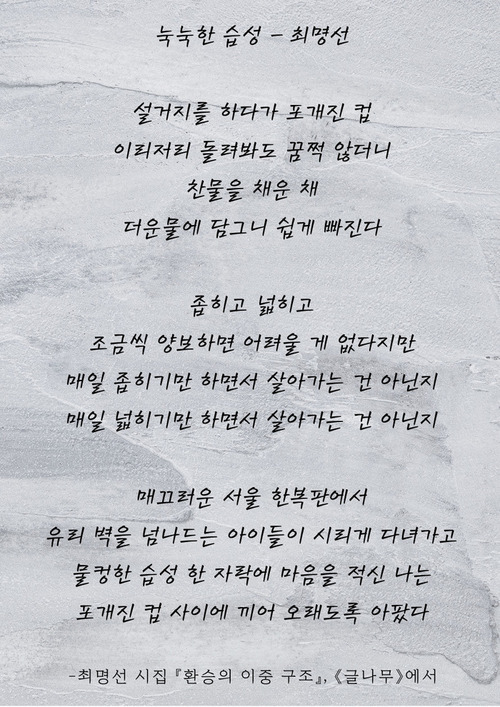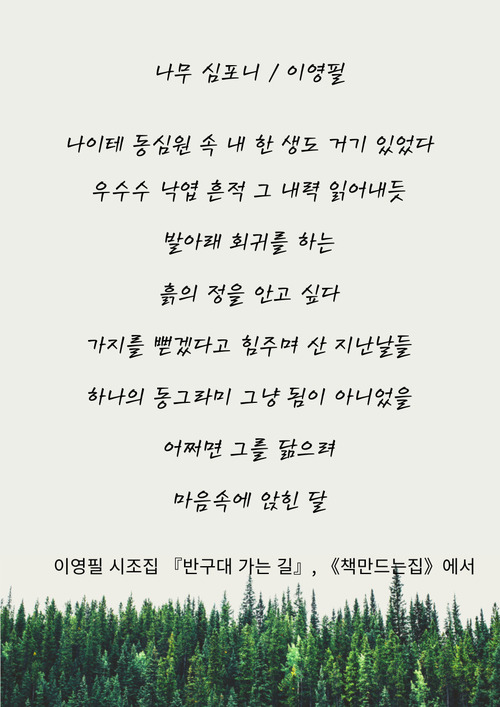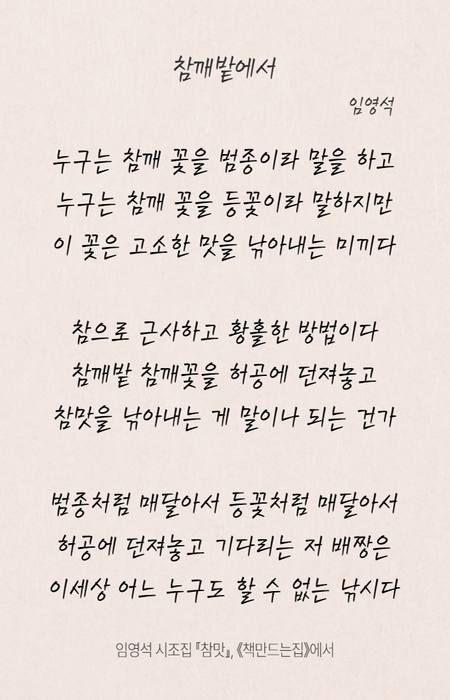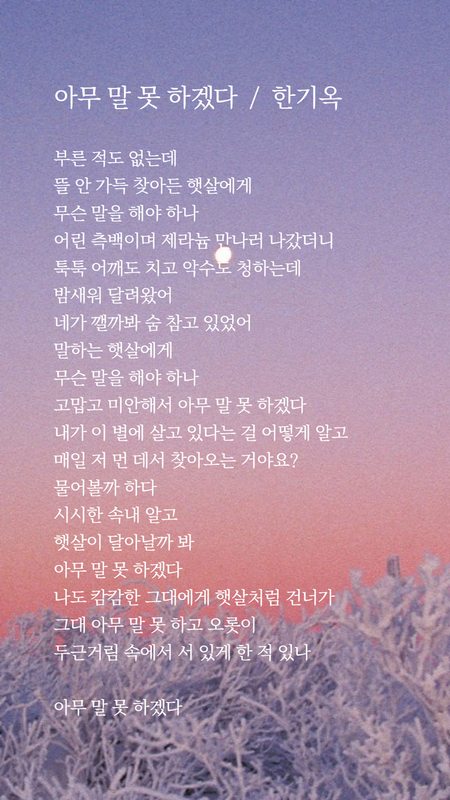[울산여성신문 정은주 객원기자] 순례자들의 숙소인 알베르게에서의 새벽 풍경도 조금씩 익숙해져간다.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챙겨서 나가는 여행자들을 보며 비밀특공대 훈련이라도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닌가 싶었는데 어느새 나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외국인들은 한 번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될 때마다 나누어서 여행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처음에 “Where are you from?”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다른 여행지에서와 같이 한국에서 왔다는 대답을 했다. 질문한 사람의 반응을 보고서야 그게 순례 길 도보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는 질문인 줄 알게 되었다.
외국인들로부터 한국인들이 산티아고에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았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잘사는가 보다며 놀라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인들도 서로 이곳에 왜 오게 되었는지 물었다. 걷는 게 좋아서 왔다는 사람, 파울로 코엘류의 <순례자>를 읽고 감동이 되어 왔다는 사람, 긴 도보 여행에서 사색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사람, 뭔가 새롭게 출발을 하고 싶다는 사람 등 각자 사연이 있었다.
나는 전혀 계획이 없다가 여행 사흘 전에 딸이 걱정되어 오게 됐다고 하니, 걷는 걸 봐서는 딸보다 엄마 체력이 더 걱정이라며 한바탕 웃었다. 아닌 게 아니라 막상 와서 보니 산티아고 순례 길에 오게 된 나의 동기는 참으로 머쓱한 것이 되고 말았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더디 걷는 나를 위해 딸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엄마를 챙기고 있었으니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웃을 만도 했다. 이래저래 지금껏 보호자로서 살아온 엄마 체면이 여기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중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도착했을 때, 세계 곳곳을 여행해 온 어떤 한국인과 대화한 적이 있다. 자신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번잡해서 걷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지 그게 궁금해서 도착지인 산티아고에 왔다고 했다.
교수로 일하면서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다녔던 그간의 여행 사연을 들려주었다. 이번 여행에 할애한 시간이 한참 남아있지만 그날로 마무리하고 가족에게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스페인 기행>을 선물로 주고 갔다. 여행에서 만나는 방향성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오늘 아침은 다른 날보다 늦게 9시가 되어서야 출발했다. 산에 둘러싸여 마치 은신처 같은 마을도 지나고 언덕 위에 옹기종기 모인 마을도 지났다. 뭐든 심기만 하면 잘 자랄 듯 기름진 토양의 넓은 들판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또 포도밭도 이어졌는데 탐스럽게 익은 포도송이들이 수확할 시기가 지나보였는데도 나무에 그대로 달려있었다.
어제에 이어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었다. 까맣게 그을린 피부는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넓은 이마가 계속 따끔거렸다. 모자조차 챙기지 않고 온 사람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싶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이었기에 지나는 마을마다 모자를 파는 가게를 찾았지만 구할 수 없었다.
다행히 여행 첫날에 만났던 인천에서 왔다는 신부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여유분의 모자를 빌려주셨다. 서로 반가워서 며칠간의 안부를 묻고는 언제 다시 만나질지 모르니 모자를 돌려줄 거란 약속은 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모자 하나로 딸과 서로 양보하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한 마을을 지날 때마다 교대로 쓰기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살갗이 타는 듯 따가운 햇볕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모자를 만들기로 했다. 햇볕을 가리는 기능을 하면 모자라 생각하고 자연에서 재료를 구하기로 했다.
나무가 많은 곳이 아니었기에 넓은 잎을 구하느라 한참 걸어가서야 구할 수 있었다. 둥글게 모양을 잡고 잎을 엮어야 했기에 질기고 긴 풀대를 구했다. 잎이 햇볕에 시들어 금방 처지는 걸 막기 위해 억새를 지지대로 썼다. 평소에 손으로 뭘 만드는 데에는 영 재주가 없던 나였지만 햇볕을 가릴 정도의 모자를 겨우 완성했다.
나뭇잎 모자를 쓴 내 모습을 본 딸이 너무 우스꽝스러우니 쓰지 말라고 했다. 원시인 같다고도 했다. 그렇지만 피부가 햇볕에 다 익을 지경인데 우스꽝스러운 것쯤은 어쩔 수 없었다. 작은 나뭇잎이 주는 그늘 한 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이후 만나는 사람마다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모자가 최고라며 엄지를 세우는가 하면 유쾌한 표정으로 사진을 같이 찍자는 분들도 있었다. 어쩐지 어릿광대가 된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았으나 모양이 어찌됐든 기능은 다했던 모자 덕분에 나의 이마는 더 상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
22km 가량 걸어서 오늘 묵을 에스테야에 도착했다. 나바레지역 중서부의 해발 421m에 위치한 도시인데 여러 산들이 마을을 품고 있는 듯했다. 입구에 들어서니 성당의 종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성당 외관을 보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사도, 성모 마리아 등 조각상이 세워져있었다. 여기가 산토세풀크로라는 성당인데 ‘성 무덤’ 성당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조각상이긴 하지만 어쩐지 ‘니 죄를 니가 알렸다!’라며 나의 죄를 물어올 듯하였다. 과연 내 죄를 내가 알기는 할까? 신 앞에서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 잠시 다소곳해지기도 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숙소를 나와 보니 주황빛 가로등 아래 야경 또한 아름다웠다. 그곳에서 먹고 자고 웃고 울며 살던 사람, 그 거리의 사람들이 수없이 바뀌어 갔을 터이다. 순례 길에 오른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 오랜 시간에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건물들과 거리의 묵묵함에도 인사를 했다. 여행이기에 익숙함과의 결별에 두렵기는커녕 더 가슴뛰는 그 시간, 모든 것에 감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