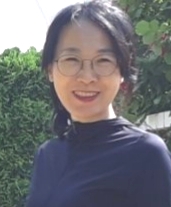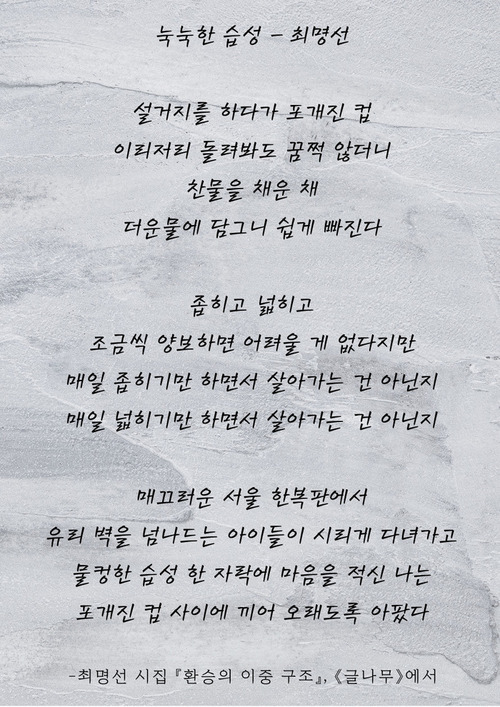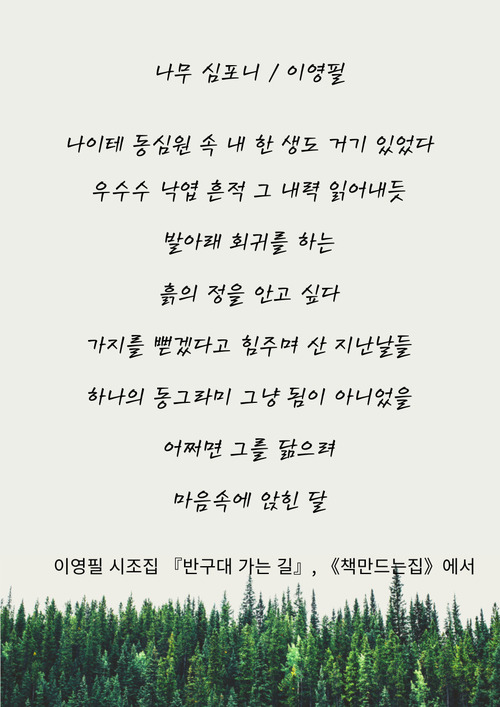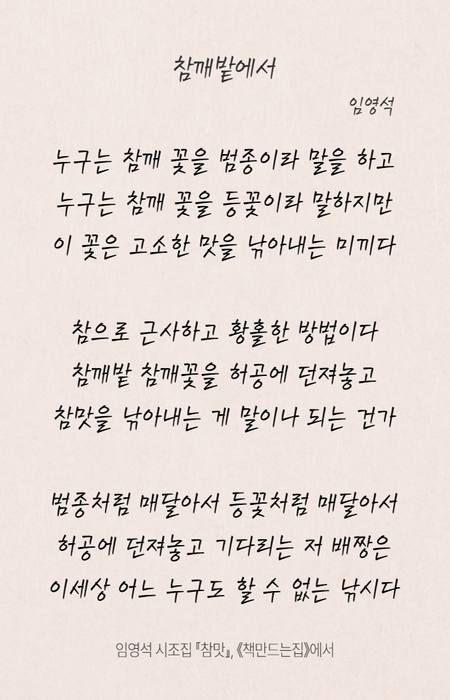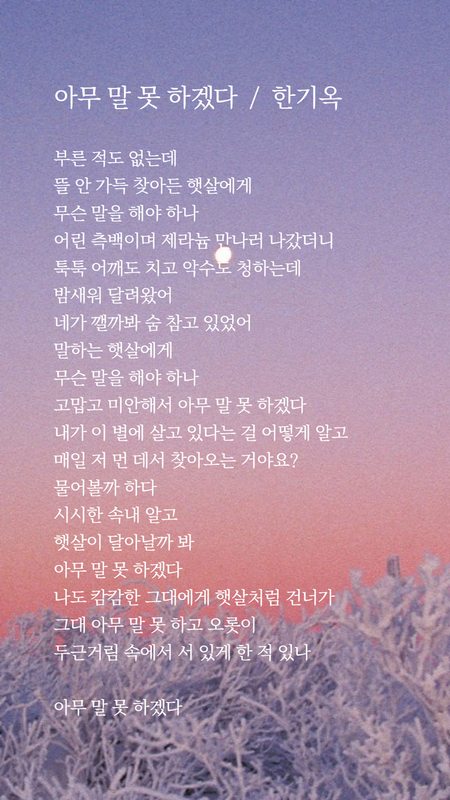[울산여성신문 정은주 객원기자] 산티아고 순례 길에 오른 지 15일째. 알베르게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시리얼과 우유로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오늘도 진통제를 두 알 먹었더니 어제보다 더 심하게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 또 토했지만 일단 출발.
25km 가량 걸어 프로미스타(Fromista)까지 가기로 했다. 700~800m 고원에 자리한 마을인데 로마 시대부터 밀 생산지로 유명한 곳으로 라틴어로 ‘곡식’을 뜻한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려니 등 뒤 동쪽에서 서서히 먼동이 터오고 있었다. 시간에 따라 하늘이 빚어내는 신비한 빛깔에 생명이 태동하는 듯하여 가슴 벅찼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고 했던 헬렌 켈러의 기도는 얼마나 절실했을까.
저 멀리 해발 940m의 모스텔라레스(mostelares) 언덕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고 그곳을 향해 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의 두 다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하나의 장벽 같아서 행여나 옆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는지 살폈지만 그런 건 없었다.
떡하니 버티고 있는 언덕을 향해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고 구불구불 오르막길을 더디게 올랐다. 중간에 몇 번을 쉬며 아래를 보니 지나온 길과 평야가 한눈에 들어왔다. 날개가 있어 훨훨 날아가면 속 시원하겠지만 어렵게 걸어온 길을 보니 조금 위안이 됐다.
고개 마루에 올라가니 쉼터가 있고 게시판에 여행자들이 써 둔 글귀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엄마가 보고 싶다’는 문구에 맘이 짠했다. 어떤 이는 기껏 올라왔는데 폰을 두고 오는 바람에 다시 내려갔다 왔다며 욕을 써놓은 이도 있었다. 며칠 전 어느 청년도 폰을 두고 와서 5km를 되돌아갔다고 했다. 산티아고가 뭐기에 다들 고생을 사서 하는 걸까?
언덕 반대편 아래를 보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메세타의 드넓은 평원과 함께 지평선까지 펼쳐져 풍경은 장관이었다. 눈으로 보기에도 까마득히 멀어 보이는데 정작 오늘 도착할 마을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내리막에는 경사가 17도라 나도 모르게 주춤했다. 궁여지책 끝에 뒤로 걷기도 하고 지그재그로 내려가며 경사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나처럼 절룩거리며 걷던 호주에서 왔다는 어느 여행자를 만났다. 동병상련이라더니 서로 응원을 하며 가던 중에 내리막이 나타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 마이! 갓!”을 외쳤다. 그녀는 “지그잭! 지그잭!”이라며 씩씩하게 구령을 붙여가며 내려갔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직잭”이라며 별명을 불러주었더니 소리 내어 웃었다.
노랗게 물든 키 큰 포플러 가로수 길은 풍경 그대로 가을 엽서에 담아 띄우고 싶었다. 더디게라도 따라가겠다며 딸과 ‘한’도 먼저 보냈기에 가을 정경 속에 오롯이 혼자 있는 듯했다. 피수에르 강을 지나니 발렌시아(valencia)라는 표지석이 있다. 발렌시아는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 음식인 파에야의 발상지라는데 파에야를 먹지는 못하고 지나갔다.
카스티야 수로를 따라 풍부한 물이 느리게 흐리고 있었다. 원래 팔렌시아 평원의 곡물 운송을 위해 만들었다는데 지금은 관개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물을 바라보며 걸으니 그 또한 위로가 되었다. 외국 청년 세 명이 “부엔 카미노!”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다. 엄청난 크기의 배낭을 메고도 발걸음에 힘이 넘치는 걸 보니 장정의 강인함과 튼튼함이 부럽기도 했다.
목적지를 2km 남짓 남겨두고 오른쪽 무릎 안쪽과 옆쪽이 급격히 아파오면서 의지와는 상관없이 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앞뒤를 살펴보니 아침까지만 해도 카미노에 이어지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나 혼자였다.
30cm 보폭, 양쪽 스틱에 최대한 힘을 싣고 오른쪽 다리는 끌며 더디게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딸과 한이 기다리고 있다가 놀라며 우선 병원부터 들르자고 했다. 4시쯤에 보건소 규모의 작은 병원을 찾아 벨을 눌렀는데 간호사가 스페인어로 짧게 말하고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출입문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서야 지금이 시에스타 시간이며 6시가 돼야 다시 진료를 하는 걸 알았다. ‘부상병이 왔는데 낮잠이라니’ 싶었지만 그건 내 사정일 뿐 이들의 풍습을 어쩌랴. 스페인의 관공서에서는 시에스타를 폐지하였고 순례 길에는 문을 연 가게도 많았는데 이곳 병원은 아닌가 보다.
시에스타가 끝날 때까지 2시간을 병원 문 앞바닥에 퍼지고 앉아 기다린 끝에 진료를 받았는데 ‘무릎 건염’이라며 무리하게 걸어서 염증이 생겼다고 했다. 최소 2~3일간은 걷는 걸 중단하고 쉬는 게 중요하다며 7일간 약 복용에 얼음찜질도 하라고 했다.
약국에 들러 약을 사고 가까운 카페에서 저녁을 먹었다. 옆 테이블에는 아침에 만났던 이탈리아에서 온 여행자 네 명이 식사를 하다가 우리를 보더니 인사를 건네며 비노(vino 와인)가 맛있다고 했다. 마셔보니 혀 끝 감각도 지쳤는지 특별함을 느끼진 못했다.
아침에 4도 정도였는데 밤이 되니 제법 싸늘한 데다 피곤함까지 더해 다들 얼른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딸과 한도 우리가 묵기로 한 곳이 문을 닫는 바람에 동키 서비스로 부친 짐을 찾느라 여기저기 다녔고 다시 다른 알베르게를 물색하느라 두 시간 넘게 돌아다녔다고 한다.
내일 계획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다. 멀쩡하진 않지만 그나마 도착한 게 다행인 날이라 내일을 염려할 여유조차 없이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다. 산티아고는 불면증이 있는 이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