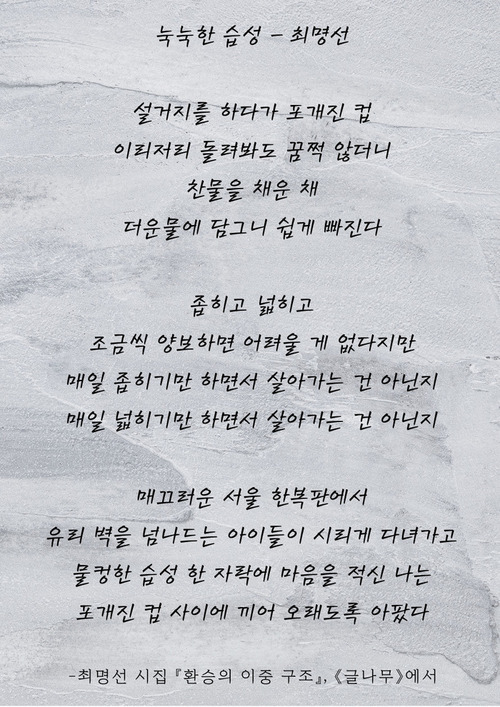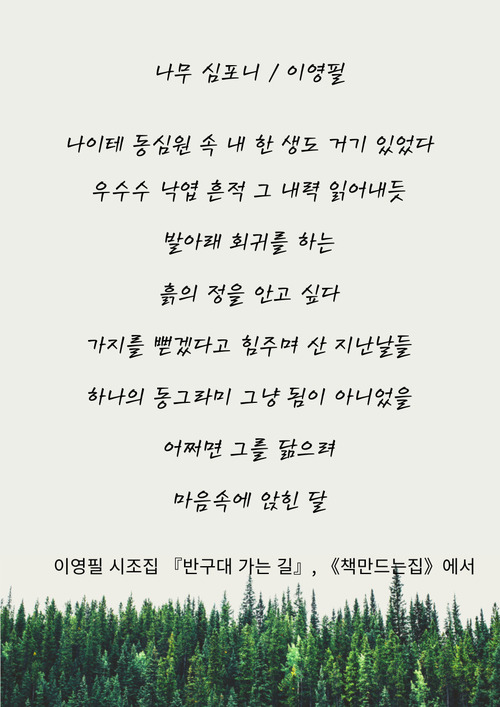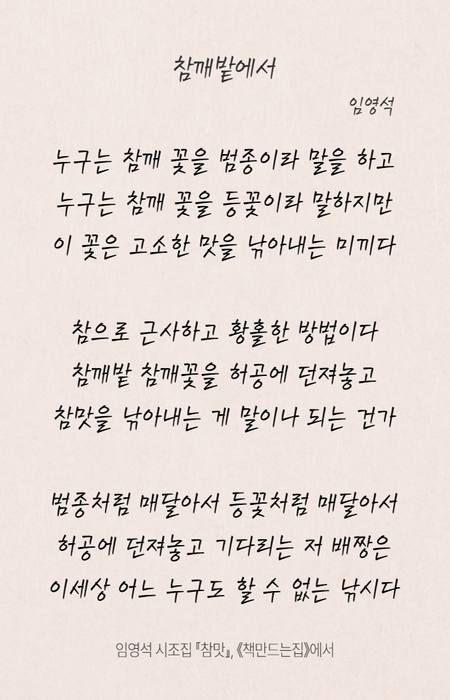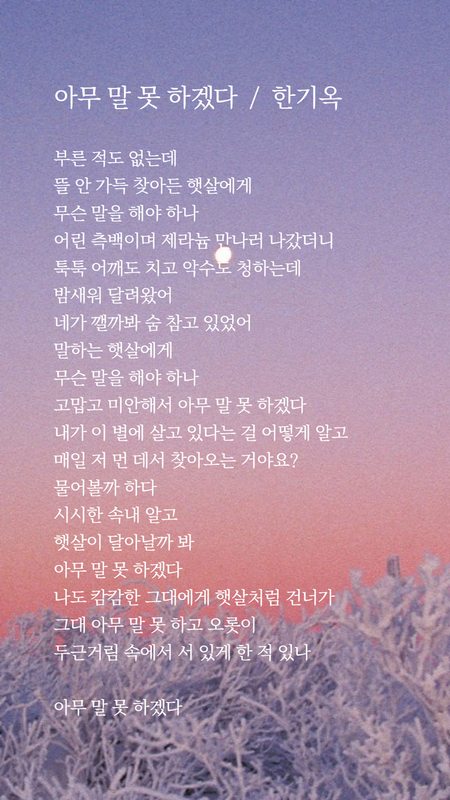[울산여성신문 정은주 객원기자] 오늘은 비가 그치고 14도 기온에 구름이 조금 낀 날씨였다. 전날에 같은 숙소에 묵은 대구에서 온 ‘한’과 광주에서 온 ‘앤’과 일정이 같아서 함께 출발하게 됐다.
나보다 두어 살 많은 앤은 세계 곳곳을 다니는 자유여행가였다. 비슷한 나이의 한도 자유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영어와 스페인어가 가능했고 안나푸르나를 등정한 적도 있다고 했다. 한과는 이후 여행을 마칠 때까지 거의 매일 동행하게 될 줄 그때까지는 몰랐다.
여행자들은 서로 한두 번 보고도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나는 ‘한국 집시’였다가 어느 때부터는 ‘울산 모녀’로 불리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여행자인데 ‘아, 그 울산 모녀?’라며 인사를 건네며 누구한테서 전해 들었다고 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나의 이름이 지어지고 있는데도 거부감이 없을 뿐 아니라 “네, 우리는 세트 메뉴랍니다”라며 웃고 넘기는 걸 보면 산티아고가 주는 여유가 아닐까 싶었다.
| ▲ 알베르게에서 내다 본 아소프라의 풍경 © UWNEWS |
|
알베르게 근처에 크루아상이 맛있는 빵 가게가 있다고 해서 들렀다. 언뜻 보기에도 맛있어 보여 집으려고 보니 빵 사이로 개미들이 기어 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놀라서 내려놨다. 하지만 낯선 상황과 풍경에 연이어 노출되다 보니 ‘이게 뭐 대수인가’ 싶어 개미를 툭툭 털어내고 먹었다.
개미도 달달한 빵이 탐이 났을 것인데 음식을 황망하게 빼앗긴 데다 졸지에 바닥에 떨어져 뇌진탕이나 안 걸렸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미안했는데 그렇다고 양보한 것은 아니었으니 착하게 살기란 역시 녹록하지 않다.
크루아상이 맛있다고 하니 여주인이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개미가..."라며 개미 기어가는 제스처를 했더니 고개를 옆으로 저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는데 놀라는 기색은 아닌 걸 보면 빵 사이로 개미가 활보하는 게 일상인 듯했다.
개미를 털어내는 제스처로 "그러나 문제없어요,”라고 했더니 활짝 웃었다. 내가 언제부터 이처럼 비위가 좋아졌는지 의아했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었다.
특별함이 반복되면 일상이 되기도 하고, 일상이지만 새삼스레 특별하게 여겨질 때도 있다. 다시 보면 새롭고 자세히 보면 시시하지 않다.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미안하다는 말을 훨씬 많이 하고 살았고 누군가의 친절을 받는 데에도 어색하던 나였는데 산티아고 순례 길에 있다는 자체로 내 안에 무언가 움트기라도 하는지도 모르겠다.
카미노엔 붉은색 토양의 드넓은 평원이 이어졌다. 스페인 최대 와인 생산지답게 이 지역에만 와인 공장이 5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오늘만 해도 몇 군데를 지날 수 있었다. 술을 든 순례자 모양의 포토 존도 있었다.
초반에 모자 없이 따가운 햇볕에 걷는 동안 나의 코가 빨갛게 익다시피 했기에 언뜻 보면 따로 분장도 필요 없이 주당(酒黨)처럼 보이기도 했다. 스페인의 태양 아래 익은 게 포도만 아니었기에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 ▲ 전날 알베르게에서 슬로바키 청년과 태극기와 슬로바키 국기가 함께 만나다 © UWNEWS |
|
세계 곳곳에서 온 여행자들과의 만남도 순례 길에서의 즐거움 중 하나다. 어제도 슬로바키아 청년과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는 원래 텐트를 치며 다니지만 비가 온다는 소식에 알베르게에 들렀다고 했다. 배낭에 국기를 달고 다니기에 내가 입은 티셔츠에 새겨진 태극기를 보여 주고는 사진도 함께 찍었다. ‘김치’나 ‘치즈’ 대신 “슬로바키”라고 외쳤더니 아주 좋아했다.
1시 조금 넘어서 도착한 아소프라(Azofra)는 아주 조용한 마을이어서 초입부터 편안했다. 우리가 묵은 공립 알베르게는 저렴하면서도 현대적 시설이라 깔끔했는데 2인 1실에다 단층 침대를 갖춘 곳이었다. 방 안에 콘센트가 없어서 휴대전화 충전을 하려면 복도에 나가야 하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다 좋을 순 없다. 하나의 침대에 잘 수 있다니 이 무슨 호강인가. 평범하다고 여겼던 생활들이 여기서는 호화롭게 여겨졌다.
| ▲ 단층 침대에 2인 1실이라 호강인 듯 여겨진 아소프라의 알베르게 © UWNEWS |
|
알베르게에서는 한 공간에 많게는 몇 십 명의 남녀가 섞여 침대를 이층으로 쓰며, 온갖 잠버릇과 소리, 냄새, 그리고 바로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속옷을 갈아입는 광경도 감수해야 한다.
며칠 전 숙소에서는 코를 심하게 고는 외국 남자분이 있었는데 숨을 몰아서 한꺼번에 ‘푸아’하고 내쉬는 바람에 다들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했다. 여행자들 사이에 그분은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다. 딸과 나는 머리만 대면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축복이었다.
| ▲ 아소프라 바(Bar)에서 담소를 나누는 할아버지들 ©UWNEWS |
|
점심을 먹으러 근처 바(Bar)에 갔더니 다른 손님은 없고 열 명 가까운 스페인 할아버지들이 식사를 끝내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숙소로 돌아와 창 너머 시골 마을 아소프라의 풍경을 느긋하게 보노라니 더없이 평온했다.
오늘까지 200km 넘게 걸었다. 남은 여행도 꼭꼭 씹어 먹는 밥처럼 맛있기를, 그리고 천천히 먹어서 소화도 잘되는 건강한 길이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