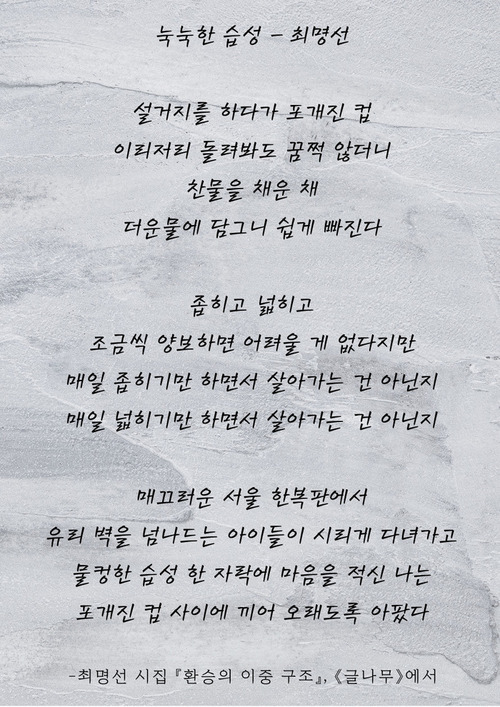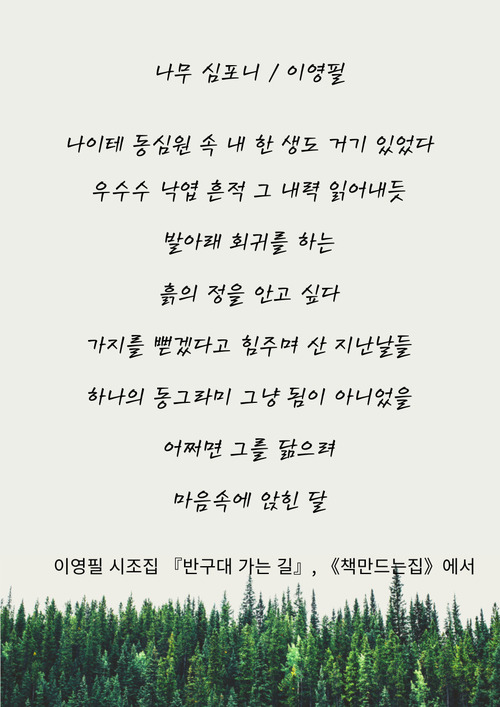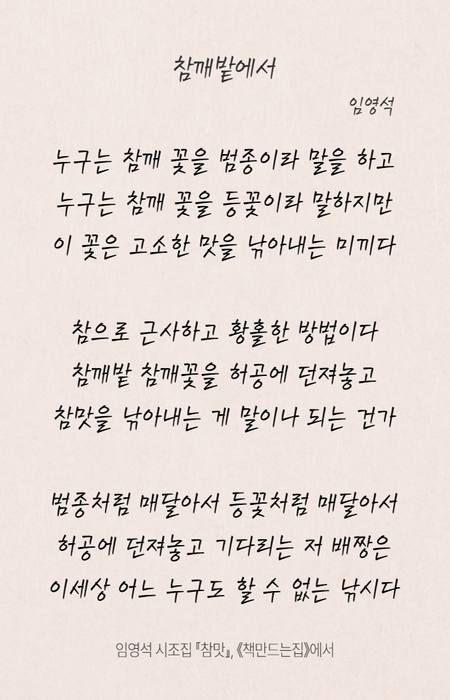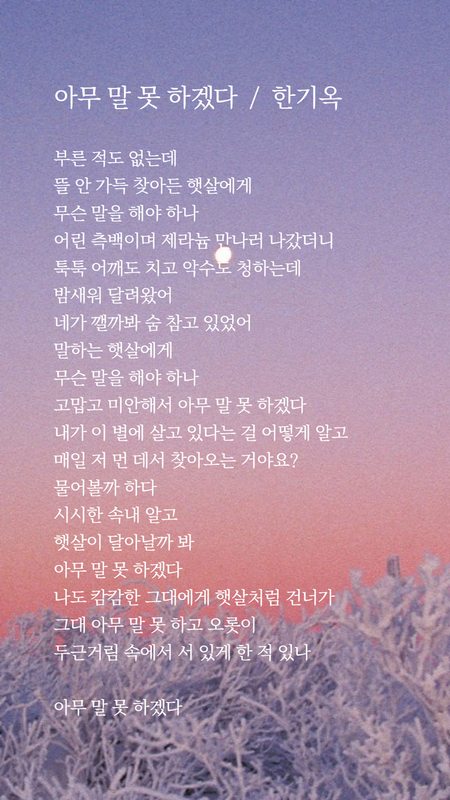[울산여성신문 정은주 객원기자] 부르고스에서의 이른 새벽, 철제 이층 침대의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알람이라도 되는 듯 잠에서 깼다. 일찍 일어난 새보다 더 부지런한 여행자들이 벌써 배낭을 꾸리고 있었다. 우리도 여명 속에 알베르게를 나왔다. 하늘은 엷은 푸른색이었고 꺼지지 않은 가로등 불빛으로 거리는 온통 주황빛이었다.
대도시라 1시간 넘게 걸어서 외곽을 벗어나니 들판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낯선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이, 낯선 것을 먹고 대대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과 마주치는 날의 연속이다. 여행은 단지 공간적인 이동만이 아니라 일상으로부터, 습관으로부터, 익숙함에서 이동하는 것이다. 크고 작은 충격을 감수한다면 길들여진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참 가다 보니 넓은 해바라기 밭이 눈앞에 펼쳐져 걸음을 멈추었다. 키가 크지도 않고 초라하다 싶을 정도로 야위고 바짝 마른 해바라기들이 동쪽을 향해 일제히 고개 숙이고 도열해 있었다. 환하고 생생하던 시절은 씨앗에 몽땅 다 부어줬는지 씨는 여물어 있건만 온몸이 검게 말라 물기라곤 없어보였다. 다음 세대에 꽃피울 씨를 가슴 가득 품고 고개 숙인 채 서 있는 모습이 마치 해를 향한 마지막 경배라도 올리는 듯했다.
15km를 걷다가 작은 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한참을 쉬었다. 다시 길을 가다가 반대편에서 나귀를 끌고 지나는 두 여행자들을 만났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른 모습이어서 랍비처럼 보이기도 했다. 각자 배낭은 짊어지고 나귀 등에는 간단한 짐만 실려 있었다. 우리처럼 등산용 스틱이 아니라 기다란 나무막대를 짚으며 이 길이 매우 익숙한 듯 여유롭게 지나갔다.
이후 도착할 때까지 하늘 아래 막대기를 휘이 내저어도 걸릴 것이 없을 듯한 길이 펼쳐졌다. 이 구간은 스페인 중앙에 위치한 메세타(meseta) 고원으로 그늘이 거의 없는 밀밭이 이어진다. 순례 길에서는 부르고스를 거쳐 레온과 같은 대도시도 지나게 된다. 첫날에 넘어왔던 피레네산맥이 있는 북부 나바라, 리오하주(州)를 거쳐 카스티야 레온주(州)가 있는 중앙으로 들어왔고, 점차 남쪽 갈리시아주(州)에 있는 산타아고를 향하고 있다.
추수를 끝낸 빈 평원에는 하늘과 땅, 사방을 둘러봐도 소실점인 듯 띄엄띄엄 순례자들이 있고, 투박한 나의 발걸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볼거리가 없고 지루하다는 이들도 많지만 그렇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다. 온갖 정보를 쉴 새 없이 받아들이느라 피로한 모든 감각들이 휴식할 수 있어서 풍경도 마음도 고요했다. 진지한 자문과 자답이 이어질 것 같지만 그저 뚜벅뚜벅 걷기만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가 주어진 듯했다.
23km를 걸어서 오르니오스(Hornill0s)의 알베르게에 도착했다. 규모가 작으면서 깨끗하였고 호스피탈레로는 매우 상냥하고 친절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이스라엘에서 온 '로즈'도 도착해 있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그녀는 커다란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인데 60세 조금 넘은 나이에 청년처럼 활기가 넘쳤고, 서울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다. 손자와 손녀 사진과 동영상뿐 아니라 작년에 딸과 산티아고에 왔던 사진들도 보여주었는데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보니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전에 만났던 대만에서 온 '린'과도 같이 얘기를 나눴다. 그녀는 20대 아가씨인데 동키 서비스로 부쳤던 배낭을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찾았다고 했다. 10개월간 인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소방관으로 일한 지 5년 되었다면서 훈련받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건물 외벽 타기, 헬리콥터에서 줄 타고 내려오기, 급류에서 인명 구하기 등 특수부대 수준이었다. 음식은 매일 알베르게에서 직접 해먹는데 오늘은 소시지를 넣고 국수를 했다며 나보고 맛보라고도 했다.
저녁이 되자 알베르게에 식사를 신청한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다. ‘빠에야’라고 하는 스페인식 볶음밥은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았다. 우리 맞은편에는 호주에서 온 61세의 부부가 앉았는데 이번이 두 번째 산티아고 여행 중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중년을 훌쩍 넘긴 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카미노 자체를 즐기는 듯했다. 모습은 다양하지만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면에서 나이, 국경, 신분에 상관없이 일종의 동지애가 생긴 듯했다.
부엌에 조리 시설이 되어 있는 알베르게에서는 여행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직접 음식을 해서 나눠먹는 것이 흔하다. 나도 한 번쯤은 닭백숙이라도 해서 같이 먹을까도 싶었지만 밥을 안 해도 되는 주부로서의 호강(?)을 조금 더 누리기로 했다.
다음 날을 위해 늦어도 10시 이전에 전등을 끄고 아침이면 침대를 비워주어야 한다. 여행 오기 전의 각자 습관이 어떠했든지 이곳에서는 하나같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어느 동요 가사처럼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라도 초대된 듯하다. 이제 씻고 푹 자면 된다. ‘새 나라의 어린이’ 모드 큐!